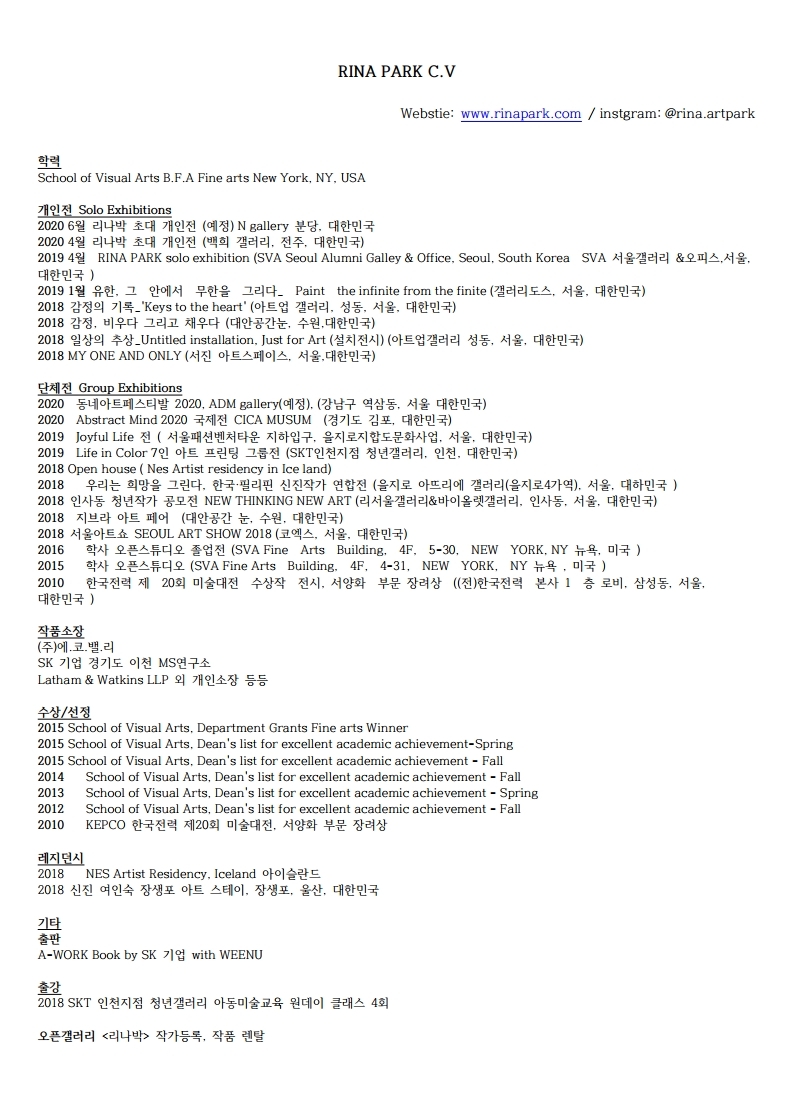< 쉼 속에서 >
백희갤러리 리나 박 초대展
2020. 03. 31 - 2020. 04. 28

< Fragments of color-색의 조각들, 120.8 x 95 cm, mixed media on Linen, 2019 >
RINA PARK ARTIST STATEMENT
작가 노트 ver2.
작품설명서
#제3의 존재
존재의 이유: 사람은 어디에선가 영향을 받고 그로부터 생각과 행동이 비롯되듯이 나의 작업 또한 나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의 집합체이다. 첫 추상 작업은 억압과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된 감정의 해소였다. 단순한 해소로 시작되었던 나의 추상 작업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그 시간 안에서의 경험이 어우러지며 내 자아와 점점 일체화 되어갔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이 담긴 작품으로 완성되었다. 내 작품은 ‘나’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한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불편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창조된 제3의 진실한 존재(=자아)이다.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한계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오롯이 진실할 수 없고 반대로 타인은 ‘나’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.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‘계산’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, 피를 나눈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일지라도 마찬가지다. 계산이 필요하지 않는 진실한 관계를 바라던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로서 작업을 받아들였고, 그것은 곧 타인과의 한 계를 극복해내는 과정이 되었다. 작업과의 관계에선 계산이 필요하지 않았고 말을 조심할 필요도 없었으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존재였다. 그 존재는 수많은 외부의 자극과 관계 속에서 내 고유의 가치와 개성을 잃지 않도록 유지시켜주었고 숨 막 혔던 타인과의 관계에서 숨통이 되어주었다.
과정: 빈 캔버스에 나의 감정과 무의식을 끌어올려 담아낸다. 내가 원하는 나의 진솔함을 담기 위해선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 상황에 따른 나의 감각들에 의존한다. 그 감각들을 깨우기 위해선 상당히 원초적이고 본능적이며 감정적 상태로의 몰입이 필요하다. (주로 음악 을 사용해서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. 격한 감정이 물밀 듯 밀려올 때는 음악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) 작업이 시작되면 머리는 마음에 따라가고 감각에 의존해 움직인다. 캔버스 위에 하나의 색이나 혹은 선이 시작되면, 자연스레 다음 과정이 이어진다. 한 번의 붓질은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 그것만으로는 확실한 존재감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. 그렇게 색을 칠하기만 하다가도 어떨 땐 그 위에 목탄이나 오일바로 긋거나 나이프로 긁고, 긁은 위에 다시 색을 채우거나 금박을 붙인다. 그리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기도 한다. 붓질과 나의 행위가 더해가고 그 과정이 쌓이면서 필요한 터치는 점점 줄어들며 더는 터치가 필요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는 절대 다른 작품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작품으로 완성된다.
상생: 완성된 작품에 남아있는 색과 긁힘의 흔적들을 보고 있자면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여가며 완성되어가는 한 사람의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. 그 제3의 존재(작품)는 내가 진실할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의 한계를 대신해주는 대체재가 되면서도, 나의 감정과 본능을 충실히 담아 시각화된 나의 무의식의 자아가 되기도 한다.
캔버스에 남겨진 선과 색 그리고 흔적들이 만들어내는 표현은 해석하기 어려운 암호처럼 보 이기도 해서 감상자는 단번에 창작자의 속내와 비밀을 읽어낼 수 없다. 그것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을 그린 것도 아니며 글로 해석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. 결국, 작품은 감상자 자신에 비추어 작품을 바라보아야 한다. 나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움직임의 기록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만, 감상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끄집어내서 나의 작품을 마주해야 한다. 나에게 작품은 타인과의 한계에 부딪혀 그 관계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존재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려는 태도이며, 어떻게든 타인에게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들도 감정을 드러내길 원함으로써,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길 원하는 ‘상생’을 바라는 마음일지도 모르겠다.